‘아리아리’는 여럿이 다 뒤섞여 또렷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동아리라는 울타리 아래 모인 각양각색의 청춘이 이리저리 뒤섞인 모양을 두고 아리아리하다 할 수 있겠네요. ‘아리아리’ 흘러가는 동아리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그 속에 ‘동동’ 떠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포착했습니다. 이번 주 여론부는 행간에 지그시 머물며 그 작은 틈새의 감정을 음미하는 문학동아리 ‘문학동인회(서울캠 중앙동아리)’를 만나봤는데요. 활자 이면에 각양각색의 개성과 감정을 새겨넣는 문학동인회의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다연 기자 almostyeon@cauon.net

얘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 부서지지 않을 걸 알렴 // 지변에 깔린 검정 무늬 불행에 살아도 / 가지에 걸린 붉음푸름 사이 주황 꿈들 나의 노래로 알렴 /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명도 / 주황빛 내릴 때 멈춰서 / 처럼 지나간 나를 / 잠시 파헤쳐 주렴 // 해를 / 바랐었고 이젠 빛에 바랜 / 바싹 마른 오렌지 한 조각 / 이게 우리 한계였지 뭐야 // 매일이 아팠지만 / 때문인 적은 없었다고 / 다 끝나고 나서 전하기 -<주검 전하기> 우영서
“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바람구두를 신은 사나이’라고 불린 프랑스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는 편지글 <투시자의 편지>에서 위와 같이 결심합니다. 랭보가 말한 투시자란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세상 너머 미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뜻하는데요. 시인은 투시자로서 새로운 시적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랭보와 같이 자신만의 문학 세계 안에서 영감을 찾아 끊임없이 방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가이자 독자로서 글로 마음을 나누는 문학동아리 ‘문학동인회’의 투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펜 자국을 따라서
7일 오후 7시, 107관(학생회관) 416호에선 올해 마지막 ‘문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향은 창작 글을 익명으로 공유해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는 활동인데요. 기자가 동아리방에 도착했을 땐 첫 번째 작품인 시 <짝사랑니>의 자유발언 시간을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기자는 수업에 지각한 학생처럼 서둘러 흐름을 따라잡고자 동아리원들의 발언에 귀를 쫑긋 세웠죠. 이현빈 동아리원(경영학부 2)이 제시한 의견이 기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저도 사랑니를 빼니 허전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니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짝사랑의 과정과 엮었어도 좋았을 듯합니다.” 이상적인 읽기 방법론을 실천하며 능동적으로 시를 이해하는 동아리원들처럼, 기자 역시 건설적인 의견을 내리라 다짐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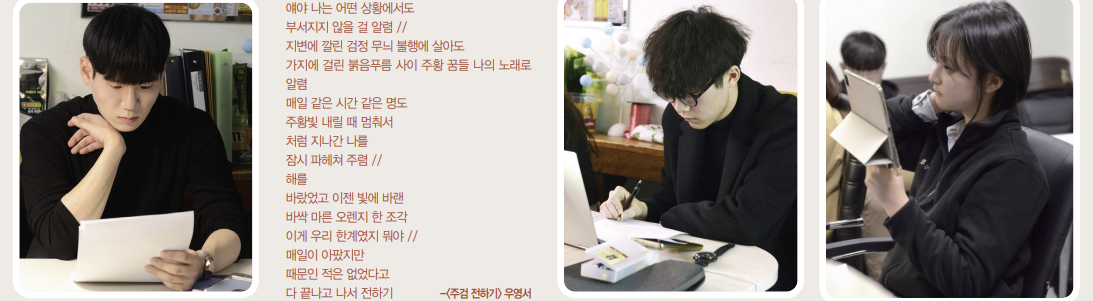
다음으로 공개된 작품은 제목만으로 장내를 술렁이게 만든 시 <주검 전하기>였습니다. 기자가 시 낭독을 지원했는데요. 입으로 직접 발음하니 시어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분간의 감상 시간을 가진 뒤 동아리원들이 돌아가며 한 줄 평을 얘기했죠. 기자도 드라마 <무빙>의 ‘주황색은 색깔 중 유일하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였다’는 대사가 떠올라 한 줄 평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마치 투시자의 시선에서 본 것과 같이 날카로운 해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근우 동아리원(철학과 3)은 시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분석했죠. “‘가지에 걸린 붉음푸름 사이 주황 꿈들’은 붉은 잎과 푸른 잎 사이의 주황 잎이라고 생각해요. 곧 말라비틀어진 낙엽이 ‘주검’이 되고, 그것이 ‘바싹 마른 오렌지 한 조각’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모두를 울컥하게 만드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서현빈 동아리원(영어영문학과 2)은 ‘주검’이 낙엽이라고 했을 때, ‘해’와 낙엽 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읽힌다고 전했습니다. “‘매일이 아팠지만/때문인 적은 없었다고’라는 구절이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 같아요. 자식이 ‘해’이고 부모가 낙엽이라면 ‘해’, 즉 자식으로 인해 매일 말라가지만 그럼에도 자식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동아리원들의 해석을 들을수록 시를 지은 작가가 누구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흥분과 긴장 속에서 작가로 공개된 우영서 동아리원(경영학부 3)이 해설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연시라고 생각하며 이 시를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해석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웃음)” 이어 제목의 비밀을 밝히자 곳곳에서 깨달음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닳을 대로 닳아 없어진 상태, 즉 진심이 죽은 ‘주검’ 상태에서만 마음을 전하게 되는 현상을 표현했어요. ‘주황 꿈’과 ‘검정 무늬 불행’의 앞 글자를 따 ‘주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게 정답’이란 우영서 동아리원의 말처럼 문향 내내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 사이 즐거운 저울질은 계속됐습니다.

마침표를 넘어
마지막으로 시 <11월, 대한민국>이 공개됐습니다. 기자가 출품한 번외 격의 작품인데요. 11월에 개화한 벚꽃을 다룬 인터넷 글에서 영감을 얻어 쓴 시였죠. 이를 기후 위기를 향한 경고로 여겨 문제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주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쓴 동아리원들의 작품을 이미 감상했기 때문일까요. 시어를 고를 시간도 없이 급히 작성한 기자의 얄팍한 시를 동아리원들에게 공개하는 게 미안하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동아리원들은 진지하게 감상에 임했습니다. 서정시의 탈을 쓴 참여시 같다거나, 생태주의적이라는 등 동아리원들의 다양한 해석이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이근우 동아리원의 색다른 해석이 기억에 남았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염두에 두고 썼을 지도 몰라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현실을 외면하는 양상을 표현한 것이죠.” 단순한 활자 너머의 의미를 포착하는 동아리원들의 시선은 진정한 투시자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중대신문 기자의 글 같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작가를 쉽게 짐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민망하면서도 기자로서 체화된 문체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동아리원들이 글 하나로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는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이근우 동아리원은 문향의 매력을 얘기했습니다. “혼자 글을 읽으면 내 생각에만 매몰되곤 하잖아요. 문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내 해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거의 매주 문향에 참석한다고 밝힌 박주성 동아리원(물리학과 4)은 문학동인회에서 값진 피드백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홀로 시를 썼던 저는 독자가 없는 작가였어요.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들었던 의견이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글이라는 것이었죠. 그 의견을 마음속에 새겨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행의 길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시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 랭보처럼 동아리원들은 저마다 치열하게 단련하고 있었죠.
올해 마지막 문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향에 참여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의 작품에 관심과 존중을 보이는 동아리원들의 태도였죠. 천재 시인으로 회자되는 랭보는 자신의 시에 대한 이해를 갈구하다 5년 만에 절필했는데요. 결국 작가가 펜을 놓지 않고 작품세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의 진심 어린 감상이 필요하단 것이죠. 기자는 문학동인회에서 펼쳐지는 건강한 ‘투시’의 과정이 작가에게 좋은 창작의 동력이 되리란 걸 느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이르는 여로에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문학동인회로 향하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