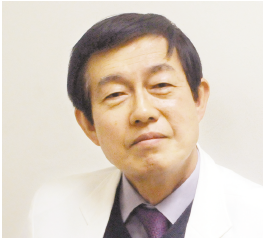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신경외과 의사인 황성남 교수(의학부). 그는 의사란 환자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여기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크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더라도 한 명의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 겪는 고통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한다. 1985년부터 31년간 중앙대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살아온 ‘인간적인 의사’ 황성남 교수를 만나봤다.
‘인간적인 의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환자에게 안 좋은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대답하는 그. “내가 환자라면 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겠느냐 또 나라면 내가 처방하는 약을 먹겠느냐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죠.” 이런 노력과 마음이 그를 인간적인 의사로 불리게 한 것은 아닐까.
평생을 신경외과에서 근무한 그는 의대 학부생 시절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다. 신경해부학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한 그는 신경외과에 지원하게 됐다. “당시에는 성적이 좋아야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가면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죠.(웃음)” 그러나 뇌 신경, 척수신경 등을 다루는 신경외과는 생명과 직결돼 요즘 학생들은 지원을 꺼린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판 그는 우리나라의 신경외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세계신경외과학회’의 공식학술지인 좬세계신경외과학회지좭 8월호에 그의 논문인 좥한국 신경외과 역사좦가 소개된 것이다. “논문엔 한국 신경외과학의 성장과 발전이 담겨있어요. 우리나라 신경외과 역사를 알려 보람찼죠.” 그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술하던 6·25 전쟁 당시의 한국 신경의학을 설명했다. “미군과 덴마크 의사들까지 한국에 그들의 의학교육을 전파하고 직접 수술방식을 알려주면서 의학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또 그들이 떠나고 남긴 장비들로 많은 성장을 이뤘죠”
오랜 세월 중앙대에 몸담고 있던 그는 학생들과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해 아쉬워했다.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학생들과 오랜 시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임상의학을 강의하는 탓에 그러지 못했어요. 좀 더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퇴임을 맞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황성남 교수는 새롭게 나아갈 학생들과 의료종사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각각의 뜻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슈바이처와 같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의미도 좋지만 저는 의료종사자들이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