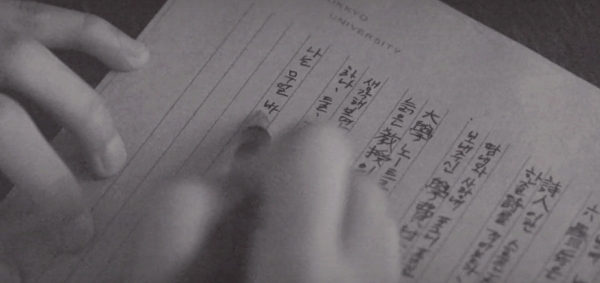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作 <서시> 전문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읽을수록 시린 <별 헤는 밤> 속 구절이다. 끝까지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던 우리의 시인, 윤동주. 별처럼 빛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마침내 찬란한 봄이 오기를 희망하던 그의 시는 여전히 가슴을 파고드는 울림을 준다.
희망의 길을 따라 걷다가
윤동주가 남긴 연필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처했던 어두운 현실과 삶에 대한 고뇌를 마주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가 참회와 괴로움으로 칠해진 시를 쓴 건 아니다. 으레 청춘이 그렇듯 한때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푼 적이 있었다. 영화 <동주> 속 윤동주는 연세대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북간도를 떠나 경성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른다. 창밖으로 마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새로운 길> 구절이 귓가에 들려온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중략)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1938년 5월 作 <새로운 길> 中
그가 가고자 했던 새로운 길의 종착지는 어디였을까. 고봉준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시를 통해 당시 윤동주가 가졌던 기대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길>에 나타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학업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자신의 모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새롭기에 희망이 있던, 그래서 열심히 살고자 했던 윤동주는 분명 펼쳐질 청춘을 기대했을 것이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았고
안타깝게도 그가 살던 일제강점기는 ‘상실의 시대’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 갔다. 그는 동주라는 이름 대신 ‘히라누마 도쥬’로 살아야 했고 자유를 빼앗겼으며 나라를 잃었다.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던 그는 자신의 얼굴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며 치욕스러워했다. 결국 윤동주는 창씨개명 후 일본으로 떠나게 되고, 영화 <동주>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전하는 <참회록>의 구절은 마음을 먹먹하게 울린다.
비참한 시대의 벽 앞에서도 윤동주는 의지를 담아 시를 써 내려갔다. 그가 연희전문학교 졸업 기념으로 발간하려 했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래 제목은 ‘병원’이었다. 윤동주는 ‘지금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인데 앓는 사람을 고치는 병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손수 제본한 원고를 가까운 후배인 정병욱에게 건넸다고 한다. 실제로 윤동주의 <병원>을 읽으면 그가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어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 누워본다.
-1940년 12월 作 <병원> 中
박슬기 교수(서강대 국어국문학과)는 윤동주가 강압적인 시대 상황을 ‘병원’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분석했다. “화자를 진찰한 의사는 병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병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간, 즉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시에 등장하는 ‘여자’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자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연에서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라는 표현은 그 여자와 나의 건강이 동시에 회복돼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직접 누워보는 화자의 행위 역시 동질성과 연대 의식을 표현한 거죠.”
김청우 교수(부경대 국어국문학과)는 병원 자체의 속성에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어떻게 보면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나누고 비정상을 가두는 공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제국의 통치 방식과도 비슷한데요. 시인은 시대가 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아갔으나 절망만 하죠. 화조차 낼 수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비정상이자 시대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앓고 있어도 병이라고 할 수 없던 답답한 현실에서도 윤동주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등 윤동주의 시에는 유독 ‘밤’이 많이 나온다. 부끄러움의 시인이라 불릴 정도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작품 <서시>에는 자기성찰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박슬기 교수는 그의 엄격한 자기 성찰이 일종의 정신적 운동이라고 해석했다. “윤동주는 시를 통해 부끄러움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야 할 감정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죠. 그는 <서시>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성찰하다가도 이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정신적 활동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이어진 거죠.” 거센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 별처럼, 그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윤동주는 언어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관한 치열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자 시도했다. 고봉준 교수는 그가 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염원했다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욕망의 배치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문학은 사람들에게 삶과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죠. 문학이 주는 울림이 커질 때 비로소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윤동주가 일제강점기에 투명하고 간결한 언어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것도 동일한 시도로 볼 수 있죠.”
예술은 바늘이 멈춘 시계처럼 그 예술이 만들어진 순간에만 붙들려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윤동주의 예술은 다르다. 그의 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진정 우리는 아프고 힘든 현실을 탓하면서도 자신을 성찰해 본 기억이 있는가. 윤동주, 그가 남긴 문장을 따라 읽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함께 누워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