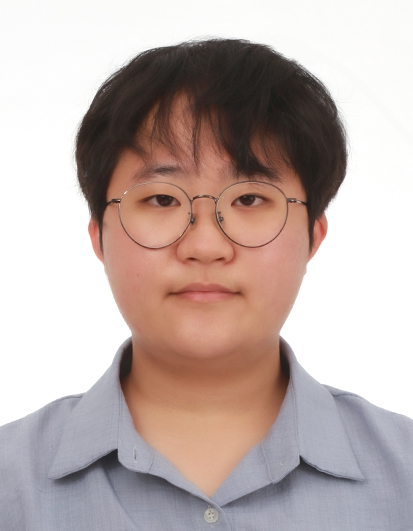어제저녁 나는 우편함에 쌓인 종이신문을 버렸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편함에 쌓이던 읽히지 않은 신문을 버리는 건 꼭 경험하지 못한 하루를 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구독 중인 신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이신문은 시답잖아서 따위의 이유는 아니었다. 그저 신문 속 내용과 나의 일상에서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신문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꼭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만 같았다. ‘나’를 빼고 돌아가는 세상에 당연한 일상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중대신문을 통해 나는 신문에서 나의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기사 중 특히 인상 깊게 읽은 기사는 정해균 기자의 ‘진심 가득 담은 타코야키’ 였다. 중앙대 주변에서 일상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에서 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입 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타코야키 한 알에도 한 사람의 열정, 수많은 선택과 결정, 삶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연한 것에서 일상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음식을 사서 먹고 그 맛을 보는 단순한 절차에서 벗어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사유하는 과정을 겪으니 나의 일상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기사를 쓰고, 조회수와 파급력을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기성 언론이 만연한 세태다. 언론의 의미가 퇴색된 오늘날, 신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는 순수성을 잃지 않고 중앙대와 주변 환경을 아우르며, 일상을 파고들어 구성원들 간 가교를 놓아주는 중대신문을 응원하고 싶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좁히는 인간미 넘치는 현장의 모습을 앞으로도 많이 담아주길 바란다.
임예원 학생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