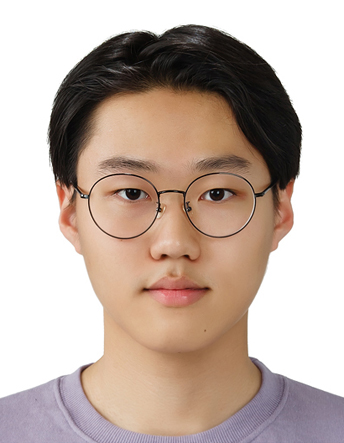‘받아쓰기만 할 거면 기자는 뭣 하러 하는 건지’ 중대신문을 입사하기 전 쉽게 내뱉었던 말들 중 하나입니다. 뉴스 카메라에 종종 잡히는 기자들을 보면 항상 높은 사람들과 유명 인사들의 말들을 주저앉아 받아적고 있었죠. ‘요즘 기자들은 엉덩이가 무겁네’ 속 편히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자가 되고 나니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무성의한 답변은 양반이고 거부에 방해에 협박까지. 취재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사로 내보내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도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절 괴롭힌 것은 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TV 뉴스를 보며 던지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죠. ‘결국엔 인터뷰이가 답변을 내놓는 대로 정리해서 기사를 쓸 뿐인데 내가 대학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있는 건 맞을까?’ 괴로웠습니다.
생각보다 중앙대에는 지적할 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맹점은 대학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대학을 취재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한번은 인터뷰이로 모셨던 전 대학평의회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본인 팔 자를 리가 있나” 누구든 자기 치부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없고 제 썩은 살을 스스로 도려내려 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뼈아팠습니다.
매일 취재요청서의 답변은 언제쯤 오려나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노라면 TV에 나왔던 기자분들이 떠올랐죠. ‘그분들도 마냥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제야 역지사지가 가능해진 우둔한 저였습니다. 결국 대학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비판할 수 있다면 대학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학내 언론이 모두 사라진 중앙대를 생각해보곤 맘을 다잡았죠.
이러한 무력감 속에서도 종종 성취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답변을 회피하는 대학본부를 뚫고 답을 구해냈을 때랄까요. 어떻게든 발로 뛰어서 실마리를 찾으면 이 맛에 기자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차오르곤 했죠. 폭우로 폐쇄된 건물의 주인을 찾다가 길 가던 시민을 통해 주인을 찾았던 순간, 인터뷰를 거부해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회사를 다른 업체 트럭 기사님을 통해 알아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은 제 기억 속에 남아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은 몇 개월을 보내며 왜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없어선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라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터뷰이를 쪼고 계실 기자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버티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푸념 한바닥 늘어놓으면서도 어떻게든 좋은 답변 받아보려 취재요청서를 구상하고 있는 오늘 밤입니다.
권오복 대학보도부 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