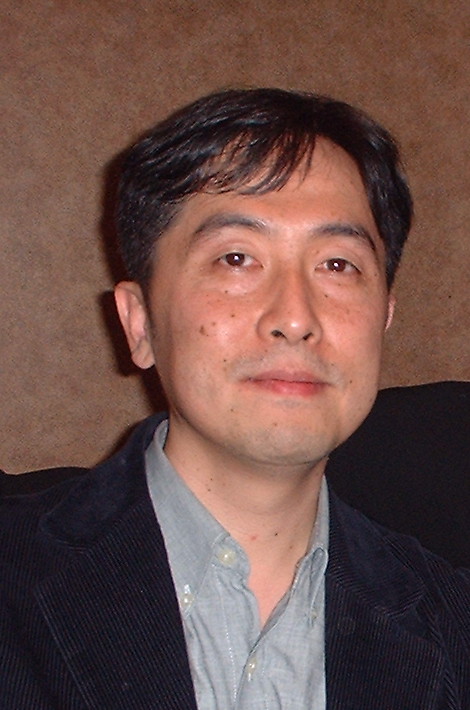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그리고 안부를 묻는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요?” “별일 없이 잘 지내요, 늘 똑같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진 통화가 끝난 뒤, 문득 ‘나는 늘 똑같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떠올랐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똑같을 리는 절대 없다. 아마도 뭔가 바뀌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무심결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습관이라 할까, 익숙해지면 잘 바꾸지 않는다. 물건을 사면 망가질 때까지 쓰고, 같은 물건을 구해서 다시 쓴다. 성격은 변했을까 생각해보니 어릴 때는 아주 내성적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외향적 정도가 된 것 같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전환점을 한 번쯤은 맞이할 텐데,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강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주 내성적’에서 ‘약간 외향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장래 희망은 우주비행사, 과학자, 야구선수 등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학문이나 지식의 깊이를 떠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숫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할 때도 무척 긴장했고, 모두가 쳐다보면 알고 있는 내용도 갑자기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수업 시간에 과제 발표 등의 경험을 몇 번 했지만 울렁증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택해 공부하던 중 처음으로 특강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주어진 한 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을 약 30분 정도 만에 다 끝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질문을 받으면서 시간을 메꾸긴 했지만, 무척 민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음 강의부터는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면서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차츰 여유도 생기고 생면부지의 참가자들과 대화도 하는 ‘약간 외향적’ 면을 갖게 된 것 같다.
지금쯤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강단에 서면 긴장된다. 특히 매 학기 첫날은 강의 오리엔테이션만 하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다. 하지만 그다음 수업부터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는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차츰 바뀐다. 단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만 빼만 아쉬운 점이 없다.
강의한다고 하면 일방통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많이 배운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른(틀린 것이 아닌) 의견을 들으면서 그 참신함에 놀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예상 못했던 질문은 더 깊이 생각하게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업을 통해 만난 학생들 덕택에 이전보다 더 외향적이 되고 시야도 약간은 넓어졌음이 틀림없다. 이 역시 바꾸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셈이다.
박광규 강사 문예창작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