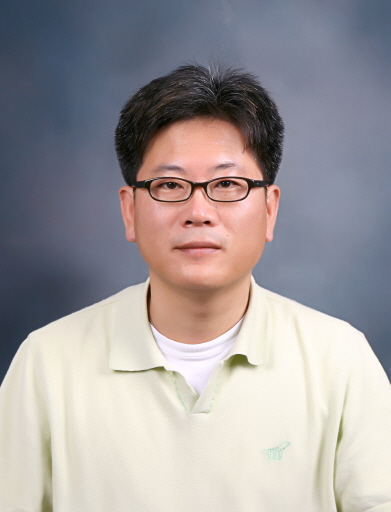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랭보, 그는 자신의 유명한 <투시자의 편지>에서 시인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투시자’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감각을 오랫동안 광대하게 그리고 이치에 맞게 착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가능한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과 문학에 있어 요즘 용어로 기존 골조는 놔둔 채 일부만을 보수하는 ‘리모델링’이 아닌 전면적인 해체를 통한 ‘재건축’인 셈이다.
시인 랭보는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 즉 사회 제도, 관습, 종교, 의식 등에 대한 저항과 반항, 나아가 파괴적 열정에 사로잡혀 시인은 자기를 둘러싼 폐쇄적이고 억압적 환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절대적인 ‘무’를 선택하려 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시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학 규칙에 대한 반항과 파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랭보 시학의 중심이 되는 이 해체의 논리는 바로 ‘무질서’ 개념이다. 기존의 형태를 뒤흔드는 의도적 무질서를 통한 파괴, 또는 해체는 부단히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단지 파괴 그 자체로만 지속되는 부정적 과정이 아니다. 실존적 삶이나 문학의 세계 모두에서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새로움 안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일치를 위해 기존의 모든 요소와 규칙 나아가 의식을 파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카오스는 코스모스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던가….
랭보는 예언자나 전지전능한 조물주 이미지의 전형적인 ‘오르페우스적 시인’에서 자신의 철저한 인식을 통해 이 세계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의 해체와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프로메테우스’ 이미지의 현대적 시인상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문학뿐 아니라 동시에 시인의 실존적 삶에서도 일관성을 보인다. 랭보의 생애에서 보듯, 시인은 짧은 문학 시기를 보내고 난 이후 문학과 완벽히 단절된 현실 세계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문학도 삶의 한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며, 삶의 광대무변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이곳에서 헤어지자, 그러면 어디에건 상관없다. [...] 그것이 진정한 행진이다. 앞으로 나아가 길을 떠나라!” 외치면서, 문학에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해체하고 현실에서 일상인으로서의 랭보를 재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랭보가 후에 문학 세계와 완전히 결별했지만, 그의 전체 삶에서 조망하면 결국은 문학과 삶의 단절이라기보다는 문학에서 현실 삶으로의 진행이며, 시인 자신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끝없는 파괴, 해체 그리고 재창조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랭보 이후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세기말에 마르크스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외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삶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할 것인가?
곽민석 연구교수 프랑스어문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