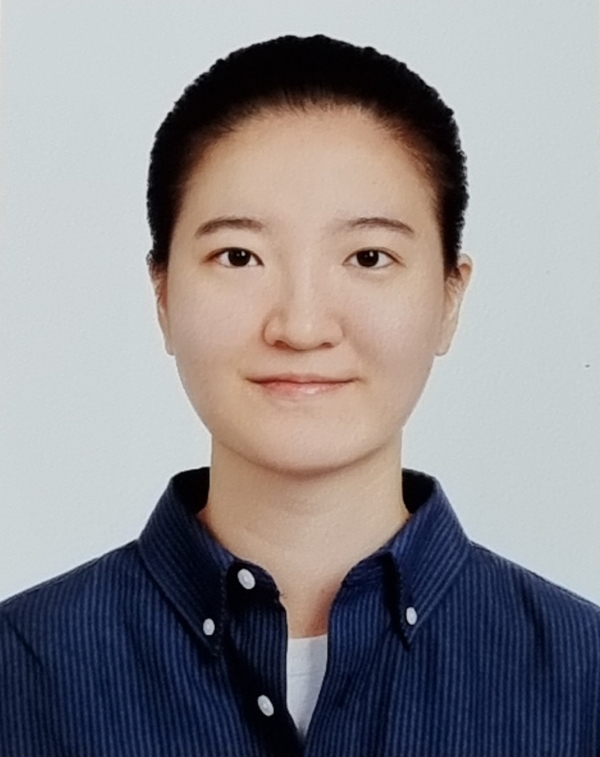피곤한 내가 눈을 뜬다. 쇠가 쇠와 맞물리는 소리, 이어폰 너머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은근 까마득히 멀어지고 있는 2019년에 나는 대학교 새내기였다. 지금껏 살던 울산이 아닌 서울. 하늘에서 표류하다 멀뚱히 추락한 사람처럼 나는 어디에서든 어둑하니 서 있기만 했다. 학교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자취하면서, 자가용이 없으면서도 무릎이 좋지 않았던 나에게 서울은 단연 지하철의 도시였다. 그러니 나는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부터 소음만 참아내면 멀미도 없이 빠르게 도착하는 지하철을 ‘괴성을 내는 철의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올라탄 매 순간 나는 짓지도 않은 죄의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선 내가 약 2시간 반 동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제대로 숨도 못 쉬지는 않을 거였다. 손잡이도 잡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와 붙어있는 옆 사람의 몸에 기대어 소설 속 한 구절처럼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라고 무표정하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서울은 익명의 도시답게 자유롭지만 나 하나의 존재를 보여주기 힘든 곳이라고 느꼈다. 내가 여기 없으면 지하철에 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서울은 나에게 두 발을 딛고 설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했다. 무채색의 터널. 그마저도 재빠르게 스쳐 가는 지하철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자칫하면 역주행을 하던 1학년, 눈치 보며 다음 정거장에 내릴 사람을 모색하던 2학년, 환승 구간을 완벽하게 꿴 3학년이 지나 4학년이 된 지금은 학교 근방의 자취방에 있다. 아예 학교 근방에서 자취하면 학교 갈 때 지하철을 탈 필요가 없다는, 그 간단하고도 당연한 사실을 3년 동안 잊고 살았다.
그렇게 걷는다. 경사가 가파른 탓에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지만 학교를 향해 걷는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푸르른 학교 뒷산도 보인다. 내 보폭대로 걷는다. 듣고 싶은 음악을 최저 음량으로 들으면서, 원하는 만큼 숨도 쉬면서 여유롭게 걷는다. 그러다 보면 동네 슈퍼도 보이는데, 싱그러운 채소나 과일을 사서 장바구니에 넣고 경쾌하게 흔들면서 신나게 돌아온다.
언젠가 나에게 한 친구가 “나는 지금껏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울산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갈 때 뭐 타고 다녀?”라고 질문한 적 있다. 나는 그 진지한 질문에 개구쟁이처럼 “울산 사람들은 고래 타고 다녀. 파란 바다 위를 헤엄치지. 고래 면허증도 필요해서 곧 재발급해야 해.”라며 당시 유행하던 말로 답변했다. 서울에서의 4년. 이미 내 일상에서 지하철의 존재는 당연해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하철이 당연하지 않은 지역으로 향하는 날을 기다린다. 빠르게 돌진하는 소음과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보다는 푸르게 흐르는 풍경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호흡할 수 있는 곳으로!
김민정 학생
사회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