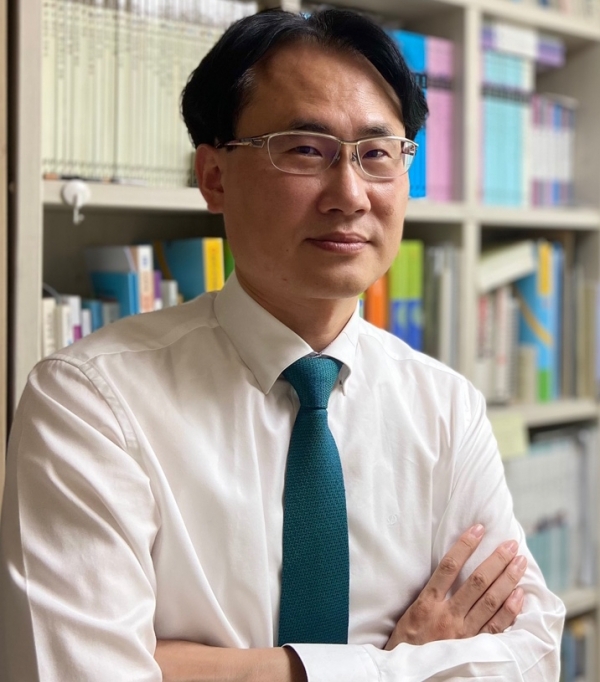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이 된 시기에 신문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 된다. 내가 속해있는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또는 이슈의 현장을 다 알 수 없고,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사건 사고 현장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담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형 사건·사고나 이슈가 터지면 기사에는 큰 제목과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배치한다. 사진은 그 기사의 간판 역할을 한다. 뛰어난 사진 한 컷은 기사를 읽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잠시 비접촉·비대면이라는 상호 단절된 사회로 만들었고, 이렇게 지친 상황 속에서 날것의 생생한 현장 사진들은 방구석 독자들을 더 몰입하게 만든다.
중대신문 제1996호의 사진 ‘시끌시끌’의 ‘굴업도’ 관련 해양 쓰레기 사진과 기사가 나에게는 특히 그랬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캠핑 장소 중의 하나가 굴업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이는 사진들은 ‘한국의 갈라파고스’, ‘배낭 도보 여행(일명 ’백패킹‘)의 성지’라 불리기엔 좀 겸연쩍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환경오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대신문에서 마주한 ‘쓰레기가 잠식한 한국의 갈라파고스, 파도에 실려 오는 폐어구에 몸살’이라는 문구와 아름다운 석양 아래 폐부표, 폐어구, 깡통, 페트병 등이 널브러진 사진은 기사에 더 몰입하게 해줬다.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바이러스를 보는 듯해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획 기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해양 쓰레기가 아닌 산호초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변용완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