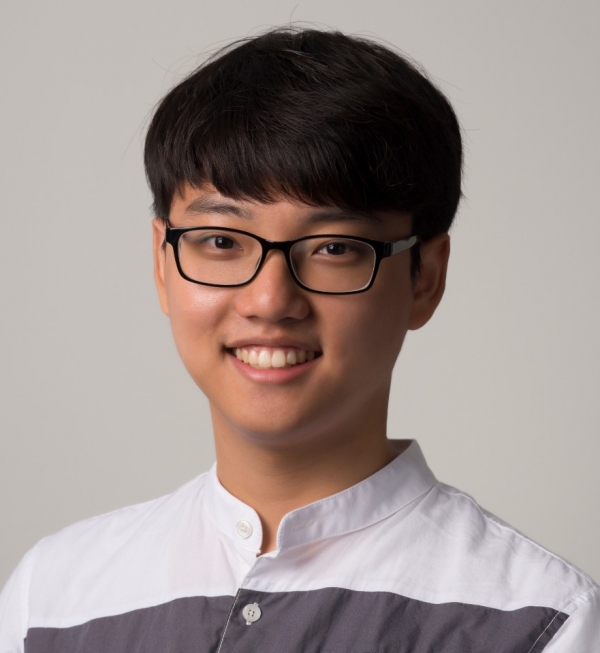평소와 같았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스크린도어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단지 자리에 빨리 앉아 편하게 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란 점자블록 위에 서 있었다. 그러자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떤 이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어르신이셨다. 나는 자리를 재빨리 떴고 아슬아슬하게 충돌하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뉴미디어 콘텐츠에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글로 변환해야 한다는 나. 장애인에 불친절한 행정을 비판했던 나. 편하게 앉아 가겠다며, 아무도 지나가지 않겠다는 확신에 통로를 가로막은 나. 모순, 그 자체였다. 어쩌면 어르신의 장애는 시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이번 학생총회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다. 발단은 장애인권위원회 일상사업국장의 발언이었다. 학생들은 학생총회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기는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서울캠 총학생회 측은 녹화가 진행 중이고 차후 내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속기록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요소다. 학생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 학생의 당연한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서울캠 장애인권위원회 일상사업국장-
그의 이야기는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다. 내게 속기록은 단지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기록이 아니라 수어 통역이 없는 환경에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학생총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아차 싶었고 속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록의 의미가 아닌 알 권리로서 말이다. 그제야 배리어 프리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총학생회가 속기를 시작했다.
앞선 예시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반복한다. 차별은 장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별, 국적, 경제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차별을 하는 우리 자신이 진짜 차별의 이유다. 차별하는 주체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차별을 당연시한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차별한다. 혹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시하는 차별은 없다. 우리가 당연시해야 할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차별하는 주체인 우리는 당연함을 깨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부끄러운 내용으로 수첩을 적어 내려가고 싶지 않다. 우선 내 행동거지부터 바로 고치겠다. 상대를 더욱 배려할 줄 아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겠다. 언론으로서 당연시해온 차별에 묵과하지 않고 과감히 비판하겠다. 기사 주제부터 표현 하나하나까지 혹여나 차별을 내포하지 않는지,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 평소와는 달라질 미래를 꿈꾸며 수첩을 닫겠다.
이찬규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