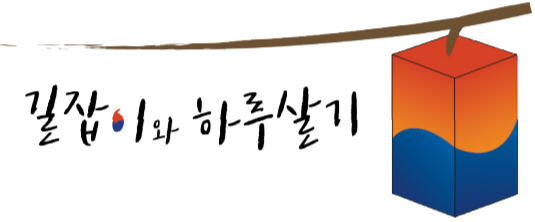
길잡이란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흔히 가이드로 대체되는 단어인데요. 이번학기 문화부 기자는 길잡이가 돼 교환학생과 남다른 한국 문화를 체험합니다. 이번주 길잡이와 교환학생은 임종체험을 다녀왔습니다. 관 속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는데요. 평소 우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그들에게 상처의 말을 건넨 적은 없나요? 숙연한 분위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기자와 교환학생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관 속에 들어가
지난날을 성찰하고
삶의 의지를 찾다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여기 삶과 죽음의 공존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임종체험이다. 깜깜한 관을 나오는 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외국인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를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달 30일, 교환학생과 함께 무료로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효원힐링센터에 다녀왔다.
마지막 가는 길은 행복하게
죽음은 다소 심오한 주제다. 죽음을 생각해본 적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프랑스에서 온 앤서니 학생(소프트웨어학부 4)이 고갤 끄덕이며 대답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게 문득 두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먼저 죽음체험 신청서에 기재된 세가지 항목을 체크한다. 현재 행복한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이다. 함께 받은 유언서에는 화장, 매장 등 장례 방법과 신체 기증 여부를 고르는 칸이 마련돼 있다.
입구 옆에 마련된 영정 사진 포토존에서 하나둘 줄지어 사진을 찍는다. 줄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표정이 의외로 밝다. 반면 앤서니 학생은 어색한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한다. 이를 본 효원힐링센터 문영임 행사팀장이 미소를 주문한다. 영정 사진을 찍을 때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영임 행사팀장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영정사진은 조문객이 보는 사진이잖아요. 딱딱한 표정보다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홀 한편엔 소원 나무도 있다. 체험에 앞서 소망하는 점을 쪽지에 적고 나뭇가지에 걸어본다. 그때 분홍색 쪽지가 눈에 들어온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항암치료 받을 때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 아픔 나눠서 제가 받게 해주세요.’ 작은 쪽지에는 자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떠날 것을
“이 체험은 죽음을 빙자한 삶의 체험이에요.” 효원힐링센터 정용문 센터장이 해당 체험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다. 이어 갈바리 의원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하루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준다. 환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연 소개와 수녀, 의사의 인터뷰 영상이다. 갈바리 의원은 지난 1965년에 국내 최초로 임종자 간호를 시작한 의료기관이다. 죽음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통곡에 억장이 무너진다. 영상을 보는 앤서니 학생 눈시울도 붉어진다. “제 할머니도 지난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슴 먹먹해지는 영상이네요.” 강의를 매듭지으며 정용문 센터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땐 아마도 저승에서 볼 것 같아요.”
인쇄된 영정사진을 들고 단체 임종체험실로 향한다. 사방이 깜깜한 이곳엔 수많은 관이 정렬돼 있다. 향로와 촛불, 유골함도 보인다. 지금까지의 삶을 성찰하는 명상 시간을 갖는다. 마이크를 잡은 정용문 센터장이 자리를 안내한다. “이곳은 죽음체험관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유서를 쓰고 모두 죽게 됩니다.” 난생처음 마주한 관과 수의를 보니 기분이 묘하다. 자세히 보니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 이는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인생무상’과 관련 있다. 정용문 센터장이 설명을 이어간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승에 갈 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돈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일상과 밀접한 프랑스의 죽음
우리나라에서는 시신을 연고지와 관련 없는 묘지에 묻곤 한다. 혹은 수목장과 납골당을 이용하기도 한다. 프랑스 장례 문화는 어떨까. 우선 프랑스에는 자치구 도심마다 공동묘지가 존재한다. 앤서니 학생 또한 프랑스인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묻힐 수 있다고 대답한다. “가족이 안장된 묘지에 함께 묻을 수 있어요. 주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 묻히죠. 작은 도시에선 한번 비용을 지불하면 한곳에 묘지를 평생 둘 수 있어요. 다만 큰 도시에선 자리를 위해 15~20년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프랑스인은 공동묘지를 혐오 시설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산호 교수(프랑스어문학 전공)는 프랑스의 공동묘지는 일종의 공원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인은 공동묘지 앞에서 산책도 해요. 우리나라처럼 묘의 형태가 둥글지 않아요. 조그마한 석조 건물 내지는 묘비석이 놓여 있어서 무섭거나 혐오스럽지 않죠.” 또한 이산호 교수는 공동묘지를 둘러싼 프랑스인의 인식은 과거 민간 신앙과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 유럽인은 낮이 살아있는 사람의 영역, 밤은 죽은 사람의 영역이라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밤이면 예전에 살던 집에 찾아온다고 여겨 공동묘지를 마을 옆에 조성하게 된 거죠. 부엌에다 음식을 놔두기도 했고요.”

지나온 삶을 깊이 성찰하다
유언서를 적는다. 한 참가자가 조심스레 유언서를 낭독한다. “이제 죽음 앞에 나를 바라보니 모두가 한낱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가게 돼서…” 울먹이던 그가 힘겹게 말을 이어간다.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여기저기서 숙연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눈앞에 놓인 관은 실제 장례에 사용되는 화장용 관이다. 이윽고 관에 들어갈 차례다. “죽은 여러분의 시신을 화장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제 관 뚜껑을 닫고 화장하겠습니다.” 어깨가 낄 만큼 비좁은 공간에서 지나온 삶을 되짚는 것도 잠시, 쾅쾅쾅쾅. 망치로 관 뚜껑을 닫는 소리가 들려온다.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이내 환히 웃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른다. 행복했던, 혹은 아쉬웠던 나날이 스쳐 지나간다. 앤서니 학생은 관 속에 있는 10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처음엔 되게 답답했어요. 삶이 짧다고도 느꼈죠. 앞으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더 늦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겠어요.”
끝으로 앤서니 학생에게 죽음을 앞둔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물었다. 앤서니 학생은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가족, 여자친구와 식사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선 꽤 행복하게 살았으니 너무 슬퍼 말라고 전할래요.” 참가자 성혜정씨(34) 역시 가족의 소중함에 눈뜨게 됐다고 전한다. “유언서에 가족과 오래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적었어요. 평소 가족에게 긍정적인 말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야겠다고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수첩: 죽다 살아난 이들이 전하는 깨달음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1944년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다. 수용소에서의 하루는 끝을 알 수 없는 긴장과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삶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 전쟁 이후 집필한 대표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를 언급한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존주의 심리이론인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개발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어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는 삶의 가치와 목표 설정에 목적을 둔 심리치료 기법이다. 한편 그는 92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30권이 넘는 저서를 내고 심리치료자로서 세계 전역에서 강연했다.
이븐 알렉산더(Eben Alexander)는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다. 그는 지난 2008년 54세의 나이에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수상태를 겪었다. 저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임사체험의 실상과 그 의미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뇌와 육체의 죽음만으로는 의식을 종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찾은 성당에서 그는 신의 존재를 믿게 된다. 그곳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천상과 음악은 임사상태에서 마주한 경관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이전 그는 속세에 머물던 의사였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이후 ‘이터니아(Eternea)’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자신이 느꼈던 깨달음을 널리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