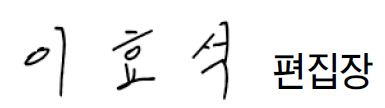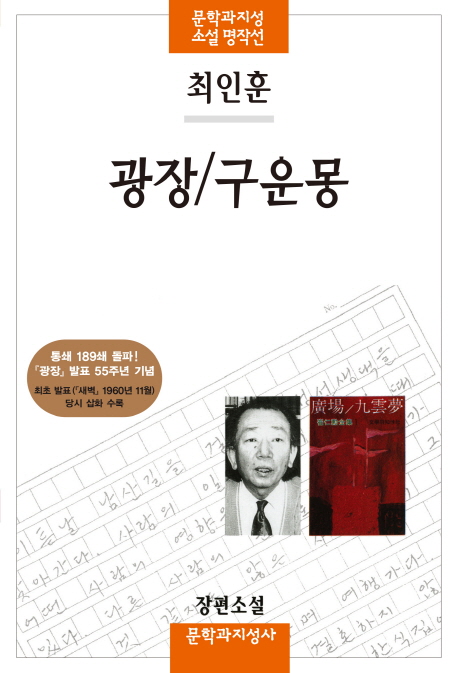
『광장』 속 명준은 냉소적인 리버럴리스트다. 명준은 헤겔을 “바이블에서 먼저 역사적 옷을 벗기고, 다음에 고장 색깔을 지워버린 후, 그 순수 도식만 뽑아냈다”고 냉소한다. 마르크스를 “여기에 경제학과 이상주의의 옷을 다시 한 번 입혔다”고 조소한다. 나아가 당시의 정치와 경제도 비웃는다. 그는 세계를 경멸한다.
그가 마주한 남한의 현실은 고독과 외로움의 울부짖음만이 들리는 작은 창 하나 내어있지 않은 밀실이다. 반대로 그가 남한의 밀실을 버리고 선택한 북한의 광장은 붉다 못해 검붉어진 깃발만이 황량히 나부끼는 공간이다. 광장 속 차디찬 동상은 싸늘한 한기를 부추긴다.
혁명을 꿈꿔 광장으로 나갔던 아버지는 처참히 전사해 철학적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명준은 아버지의 지극히 평범하고 다를 바 없는 광장에서의 삶을 목도한다. 그리곤 아버지 주검에 넋두리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광장에 모든 것을 던졌던 한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비루하고 허망한 것이었던가.
최인훈이 『광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분명 광장에서만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은 주관적 결단의 표출과 행동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한국에서는 광장에 대한 지나친 조롱이 범람한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 “장외 투쟁은 여론을 선동하는 인민재판이다” 등. 여론의 눈치를 보던 친박은 일제히 약진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광장에 대한 오래된 조롱이 부활했다.
이런 조롱의 이유는 한국의 광장엔 승리의 역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매번 광장의 외침은 짓밟혀왔다. 지난 12일 백만 개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졌던 광화문 광장의 1893년도 그랬다. 40여 명의 동학교도들은 경복궁광화문 앞에 엎드려 사흘 밤낮으로 교조 신원을 호소했다. 상소 3일 만에 고종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한다면 마땅히 소원대로 시행하겠다”는 비답(批答)을 내려 해산토록 했다. 그러나 고종은 비답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상소를 올린 주모자를 체포했다. 결국 교조신원운동은 척양왜(斥洋倭)의 정치사회적 운동을 포함하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확장됐다. 결국 조선은 마지막 남은 군사력을 내란 진압에 쏟아 붓고 외세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다.
한국에서 광장의 외침이 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던 것은 민중의 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때론 들끓는 정치적 에너지를 갈무리해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광장의 외침이 있고 난 후 지도자들이 그 진정한 민의를 깨닫지 못했고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장에 대한 외침은 일종의 푸념이나 폭동, 민란, 광기로 규정됐다.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떤 가치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을 국기문란자로 매도해왔다. 그리고 광장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한 국가는 더 큰 비극을 맞았다.
또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촛불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신의 생활을 영위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촛불은 언젠가 꺼질 뿐이며 광장은 허망할 뿐이라고 조롱해야하는 이유는 아니다. 시민들은 언제든 광장에서 밀실로, 밀실에서 광장으로 이동할 자유가 있다. 『광장』이 꿈꿨던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세계는 언제든 이동의 자유가 확보된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세계다.
광장엔 겨울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그 겨울 한파가 과연 촛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촛불이 켜지고 꺼지고는 그리 중요치 않다. 그 촛불이 남긴 촛농과 타버린 심지에서 국민들이 흘린 눈물과 까맣게 타들어간 민심을 떠올려야 한다.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요,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지금은 광장에 대한, 촛불에 대한 조롱을 거둘 때다. 그리고 백만 촛불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다. 백만 촛불은 정녕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