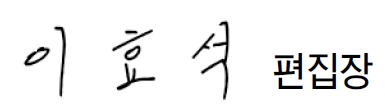“이 책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홀려 있는 과학의 이미지를 바꾸었다. 영원히.”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 이언 해킹이 쓴 서문의 문장이다. 저자 토마스 쿤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바꿨다. 그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과학에서 왜 역사가 중요한지, 과학은 왜 과학 공동체만의 전유물이 되는지, 과학을 왜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는지 말이다. 또한 쿤의 이러한 시각은 최근 경제학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한 가지 이해의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상경제학(주류경제학)’은 일원론적 방법론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해내는 과학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과학경제라는 말까지 사용한다. 이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경제사가 사라진 경제학, 수식과 그래프 중심의 현실 문제와 유리된 경제학, 다른 학문에 대해 배타적인 경제학으로 나타난다.
반면 장하준은 경제학에서 다시 한 번 역사를 끄집어낸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다소 철학적 질문으로 출발한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경제학 공동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질문도 이어진다. 이어지는 내용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다. 그는 수많은 역사 사례 연구를 통해 정상경제학이 보지 못한 혹은 묵인한 ‘변칙현상’들을 발견한다.
대개 경제학 교과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수많은 도식과 그래프들 틈에서 경제사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장하준은 역사에 대한 연구 이후 경제학에 다른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주의 학파 이외에 마르크스 학파, 케인즈 학파, 제도학파 등의 다양한 경제학 공동체가 제시된다. 그리고는 정상경제학만이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해답인가에 대해 중차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근래에 출판계뿐만 아니라 경제학계를 뒤흔든 또 한 명의 경제학자는 토마 피케티다. 폴 크루그먼은 『21세기 자본』을 두고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는 찬사를 보냈지만 정통 주류경제학자인 맨큐는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누진세는 모두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까지 나서 피케티 논문에 다양한 수치 조작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정상경제학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셌다.
피케티 역시 역사를 추적했다. 100년 동안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을 증명했다. 피케티의 또 하나의 강점은 정상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 정상경제학을 비판했다는 점이다. 정상경제학의 무기인 데이터와 실증으로 정상경제학을 공격한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학 공동체 특유의 엘리트 의식과 학문적 배타성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엔 다른 학문으로부터 얻은 논점들이 녹아있다. 이 점에선 장하준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정치사회학적 분야의 관점으로 정상경제학을 비판했다.
물론 장하준과 피케티가 ‘경제학혁명’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둘은 경제학에서 하나의 발견을 해냈고 패러다임 전환의 전조들로 추정될만한 변칙현상을 발견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경제학에 내려진 몇 가지 비판들을 극복하고 경제학에서 사라진 역사를 끄집어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과 현실로부터 유리돼가는 경제학을 비판하며 다른 학문의 다양한 연구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다시 이언 해킹의 서문으로 돌아가 우리는 ‘『과학혁명의 구조』는 역사인가? 철학인가?’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쿤은 우리에게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철학적 사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태도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특정한 패러다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자신의 학문 분야를 벗어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섭적 태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나아가는 진보인가에 대한 회의적 태도 등이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왔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만 하느냐는 질문도 가능해진 셈이다. 이것이 그의 말대로 ‘과학의 진보가 벗어나는 진보’라면, 이 책도 기존 사유에서 벗어나는 진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 과격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