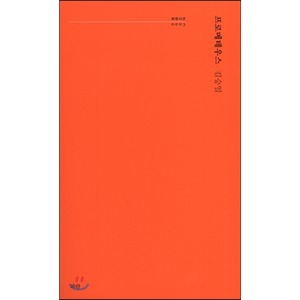
김승일의 첫 시집 『프로메테우스』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시적 주체의 통렬한 고백으로 가득하다. 피비린내와 욕설이 자욱한 이 시집은 저마다의 기억 속에 묻어 두었던 폭력의 기억을 소환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된 폭력을 고발한다.
“발각되지 않는 주먹질 개새끼에게/아픈 사람은 여전히 한 모금 즙이 되고/슬픈 사람은 완전히 증발하”(「골목 지나 사거리」)는 시절, 시적 주체는 “내 손가락 하나/부러뜨리고 내 손톱 하나하나/뜯어 버리고”(「단추 뜯기는 계절」) “손바닥을 치켜든 그 개새끼 앞에”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서 “울먹이던 나를 하나하나 모조리 기억해”(「죽은 자들의 포옹」) 낸다.
김승일의 시는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무서움과 그것이 초래할 무책임한 결과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꽃대가 사방으로 휘어져 깊이깊이 나를 찔렀”듯이 그의 시는 우리의 심장을 깊이 찌른다. 지독한 기억의 힘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월”(「화사한 폭력」)에 꽃을 피워 올린다. “당신과 나의 욕설도/무지막지한 주먹 앞에선 나약한 촛불에 지나지 않”으므로 “분노를 훔”치라고 말하는 김승일은 “불씨를 어금니에 물고 있는 어둠”(「프로메테우스」), 반복되는 고통의 자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을 기꺼이 감내한다. 그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다면 그의 시집을 펼쳐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