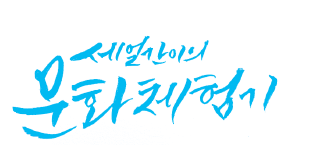
최근 개봉한 영화 <마션>에는 주인공 마크가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줄지어 정렬된 감자 줄기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세얼간이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마크의 감자밭을 꿈꾸며 도시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물 선정부터 파종,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 텃밭을 가꿨죠. 그러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마음대로 조성한 텃밭의 모습은 마치 영화 <매드맥스>의 황량한 사막을 보는 듯했습니다. 당연히 수확물도 많지 않았죠.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한 텃밭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텃밭을 가꿔왔던 과정이 세얼간이들을 웃게 한 것이죠. 세얼간이의 텃밭, 함께 구경해보실까요?

●도시 텃밭 체험기
준비부터 파종, 관리까지
스티로폼에 조성한 텃밭
함께 만들어가는 텃밭에서
수확물보다 값진 경험을 얻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4개월 동안 직접 가꾼 텃밭에서는 정말 뿌린 만큼만 거뒀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기자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무작정 텃밭 가꾸기에 뛰어들었다. 농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에 파종부터 관리까지 뭐 하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 한마디와 ‘근자감’을 바탕으로 제멋대로 텃밭을 가꾸었다. 수확물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다. 텃밭과 함께한 4개월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면 된다”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행동주도형’. 조사 따윈 필요 없었다. 무엇을 심을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양재 꽃시장’으로 향했다. “다 잘 자라요.” 파종 시기며 키우는 방법이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통에 종묘상 직원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 잘 자란다는 말뿐이었다. ‘그래, 잘 자라겠지.’ 노력을 쏟으면 자연의 섭리도 거스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적상추, 미니배추, 방울토마토 등을 골라잡았다. 씨앗이 자랄 포근한 분양토 3포대까지 짊어진 기자들의 마음은 이미 수확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꽃시장에서 돌아온 기자들은 기세를 몰아 흑석시장을 돌아다니며 스티로폼과 양파망을 구하기로 했다. 스티로폼은 작물을 심을 화분의 역할을, 양파망은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텃밭에 필요한 준비물은 모두 마련됐다.
텃밭을 가꾸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햇볕이 잘 들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편집국과 가까운 장소를 물색한 결과 선배 기자의 집 앞 공터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편집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햇볕도 잘 드는 최적의 장소. 멀리 ‘서울 N타워’와 흑석 주택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조망권은 덤이었다. 건물 주인의 허락을 구한 뒤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야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본격적으로 텃밭 가꾸기에 돌입. 미리 구해둔 스티로폼에 구멍을 뚫은 뒤 양파망을 덮고 그 위에 분양토를 부었다. 스티로폼 4동에 각각 적상추, 미니배추, 혼합쌈채소, 방울토마토를 심기로 했다. 5cm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20알 정도의 씨앗을 구멍마다 듬뿍 뿌렸다. “시골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는 한 기자의 말과 ‘강한 놈만 살아남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해져 평화로운 텃밭에 자유방임을 바탕으로 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을 조성해버렸다. 이 행동이 훗날 큰 걸림돌이 될 줄이야.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주고 나니 무사히 임무 완료. 물을 주며 수확물을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
텃밭을 가꾸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햇볕이 잘 들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편집국과 가까운 장소를 물색한 결과 선배 기자의 집 앞 공터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편집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햇볕도 잘 드는 최적의 장소. 멀리 ‘서울 N타워’와 흑석 주택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조망권은 덤이었다. 건물 주인의 허락을 구한 뒤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야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본격적으로 텃밭 가꾸기에 돌입. 미리 구해둔 스티로폼에 구멍을 뚫은 뒤 양파망을 덮고 그 위에 분양토를 부었다. 스티로폼 4동에 각각 적상추, 미니배추, 혼합쌈채소, 방울토마토를 심기로 했다. 5cm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20알 정도의 씨앗을 구멍마다 듬뿍 뿌렸다. “시골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는 한 기자의 말과 ‘강한 놈만 살아남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해져 평화로운 텃밭에 자유방임을 바탕으로 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을 조성해버렸다. 이 행동이 훗날 큰 걸림돌이 될 줄이야.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주고 나니 무사히 임무 완료. 물을 주며 수확물을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
자전거 국토종주를 다녀온 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텃밭의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한 구멍에 너무 많은 씨앗을 심은 탓인지 수많은 새싹들이 한곳에 엉겨 잘 자라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많은 수확물을 얻고자 했던 욕심 많은 초보 농부들의 실수였다.
“미련없이 다 뽑아버려.” 패닉에 빠졌던 기자들은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나마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인 1~2개만 남도록 솎아주었다.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텃밭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잠시 한눈판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나서야 관리에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텃밭은 자연스레 관심에서 멀어졌다. 10분 거리였지만 텃밭까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작물들은 성장이 멈춰버린 듯 대부분이 떡잎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다. 초라한 3~4개의 미니배추만이 초보 농부들의 체면치레를 해주고 있을 뿐. ‘누군가는 돌보겠지’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 기자들 사이에서 ‘텃밭’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금기어가 됐다.
“안 되겠다. 텃밭의 위치를 옮기자.” 중앙대 외부에 두기보다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편집국에서 무조건 가까운 곳을 섭외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은 편집국 위층 공터. 햇볕도 잘 들고 가까워 관리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앞으로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마음가짐도 고쳐먹었다. 공강 시간이나 기사를 쓰면서 틈틈이 물도 주고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들도 제거해줬다. 혹시 영양소가 부족할지 몰라 퇴비가 될 만한 것들을 흙에 섞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텃밭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11월이 찾아왔다. 4개월이 지난 후 텃밭의 모습은 애초에 상상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과는 실패에 가까웠다. 미니배추가 고군분투했고 치커리 한 덩이, 이름 모를 채소 한 덩이가 최종 결과물이었다. 애초 목표는 채소를 길러 ‘흑석동 삼겹살 파티’를 개최하는 것이었으나 최종 수확물은 한 끼 비빔밥 정도가 적당해 보였다. 비록 실패했지만 텃밭 자체가 준 의미는 컸다. 텃밭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매개물이었다. 각자 컴퓨터만 바라보며 살던 기자들은 흙내음을 맡으며 웃음을 수확했다. 텃밭이 망했어도 즐거운 이유다. 일상이 지루한 이들이라면 텃밭을 가꿔보는 것은 어떨까.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웃게 만들 테니까.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