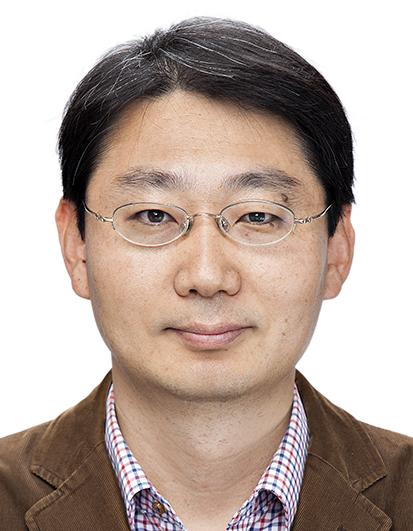20대에 물리학자의 길을 선택해 제동장치 없는 기차처럼 지난 30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없었더라면 이번학기도 강의, 국내외 학회 출장, 공동연구차 해외 연구소 방문, 실험데이터 분석과 논문작성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한가하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강제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교수 직업의 특성상 ‘나이 오십’이 주는 중력은 못 느꼈을 것이다. 해외 학회와 실험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돼 잠시 멈춰서 삶에 관해 성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104관(수림과학관)을 나와 303관(법학관) 오른쪽의 계단을 오른다. 후문 쪽에 다다르면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른다. 마스크도 한몫하겠지만 평소에 운동을 게을리한 대가다. 아! 나도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나이구나. 100세 시대에 ‘50’이라는 숫자는 딱 절반이다. 하지만 체험 시간은 10대 때 10km, 20대 때 20km, 30대 때 30km로 점점 빠르게 느껴진다고 한다. 체험 시간으로 치면 나는 인생의 봉우리를 이미 넘어 하강을 시작한 지 꽤 됐다.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제2의 인생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공자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어 오십에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다(五十而知天命)”고 한다. 나이 오십을 가리키는 말인 ‘지천명’은 하늘의 뜻과 원리를 안다는 뜻이다. 한때는 삶의 의미와 인생에 대해 날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아야 백여 명의 학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논문을 쓰기 위해 애쓴다. 비록 자그마한 발견이나 관측이지만 선취권을 노리는 과학자의 전형이다. 공자의 학문과 나의 것이 오롯이 같지 않아 ‘지천명’을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 물리학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한다. 나의 학문의 일상이 이런 모토와 괴리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갈수록 연구논문을 둘러싼 생태계도 상업화돼가고 있다. 논문 생산-소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출판된 논문은 교수업적과 연구비 평가의 잣대다. 기계적 공정성에 경도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출판된 논문의 양과 질은 그나마 객관적 잣대로 여겨진다.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방식도 종래에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20대와는 달리 나는 지금의 방식대로 정년까지 연구를 하겠지만!
이번 위기는 인류가 문명사적 변환기의 변곡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다. 앞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뉴 노멀’ 시대의 패러다임이 자못 궁금하다. 현 사회경제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탐욕과 생존본능에 여전히 기반을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신인류로 진화의 서곡이 될 것인지.
지금 20대인 대학생들은 ‘코로나 팬데믹’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매년 학기 초마다 캠퍼스를 생동하던 신입생의 활기찬 젊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앞으로 몇십년 뒤에는 캠퍼스에서 대면 강의를 하는 것은 생경한 풍광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광용 물리학과 교수